
이산하 시인의 [악의 평범성]을 읽고 그의 에세이집도 읽어보기로 했다.
[적멸보궁 가는 길]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하필 그 책을 유일하게 구비한 동네 도서관이 문을 닫았기에 다른 도서관에서 [피었으므로, 진다]를 빌려왔다.

작가는 앞서 소개한 바 있지만, 장편서사시 '한라산'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고초를 당했고 그 일은 작가에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다. 그의 시도 그렇지만 그의 에세이도 허무주의와 우울이 짙게 깔려 있다. 최근 그의 근황에 의하면 대장암 투병중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설사 작가가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난 한 개인이 할 바는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라산'이란 그의 시가 우리 역사에 남긴 족적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싶다.
하지만 그 시로 인해서 구속되고 고문당한 트라우마는 시인의 한평생을 고통과 허무로 몰아넣은 것만 같다.

이산하 시인이 다룬 절, 암자는 모두 27곳.
이 중에서 내가 가본 곳은 얼마 없다. 상원사, 통도사, 부석사, 보문사, 낙산사 정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올봄 꼭 다녀오고 싶은 곳은 '선운사'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피었으므로, 진다'는 바로 선운사를 다룬 글 제목이기도 하다.
그곳의 동백숲에 핀 붉은 동백의 물결을 느껴보고 싶다.
수령이 5,600살인 동백나무가 3천 그루 정도 있다고 하는데, 상상이 되질 않는다. 상상이 되지 않을 때는 직접 보면 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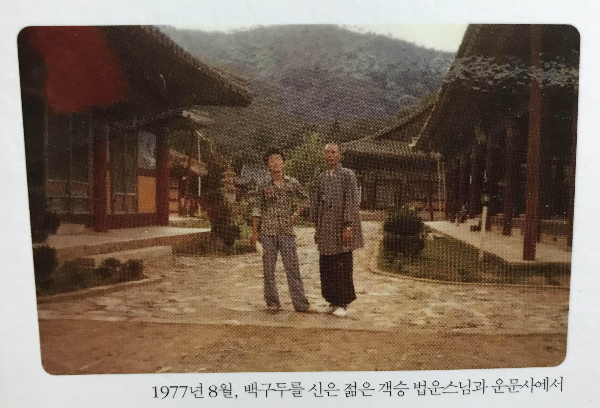
-읽으면서 든 이런 저런 생각들
'미황사'편에서 펼치는 저자의 '비교'에 대한 독설은 지나치다. 그의 감정이 추론을 과도하게 만든 것 같다.
"비교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전쟁을 낳고, 전쟁은 악마를 낳는다. 그리고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인간은 피라미드 같은 세상의 벽돌 한 장이다. 위에서 밟을수록 더욱 아래를 밟는다.가장 밑바닥의 벽돌이 가장 먼저 부서진다."
약자가 강자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비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비교'는 우리 인식의 출발이라고 봐야 한다. 비교 없는 인식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탓이다. 비교가 경쟁을 낳을 수도 있지만, 비교가 경쟁만을 낳는 것은 아니며, 비교 덕분에 앎,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운문사' 편에서 조계사 불전함에서 순복음교회의 헌금봉투들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까지 읽으면 교회가 불전함에 시주를 할 정도로 너른 마음을 가졌구나,하는 마음을 잠깐 갖게 된다. 하지만 그 봉투에 "예수 믿으면 천구! 불신자는 지옥! 아-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대목에서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독교회의 편협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밖에 없어 씁쓸하다. 물론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가 편협하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은혜사' 편에서 비구니 선방인 백홍암이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서]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길 위에서(2012)]는 이창재감독의 비구니 스님들을 다룬 것으로 몸의 가치, 고행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 무척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각연사'편에서 삼족오에 대해 잠깐 언급하면서 삼족오가 용의 심장을 먹는다고 하는데, 처음 들은 이야기라서 흥미로왔다. 그리고 극락에 거주하는 상상의 새 '가릉빈가'가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단골소재라는 것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
'원심원사와 석대암'편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고 죄인의 벌을 스스로 다 짊어지려고 하는 민중적 보살이란다. 마치 예수를 떠올리게 한다.
'산방굴사'편에 나오는, 불상 앞 높은 절벽에서 자란다는 암벽식물 지네발란과 풍란이 보고 싶다. 언젠가 제주도에 간다면 꼭 그곳에 들러서 확인해볼 생각이다.
'봉원사' 편에서 시인은 신촌 봉원사에는 박상륭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와 기형도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을 옆구리에 끼고 가고 싶다고 했다. 박상륭의 소설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시인에게 그토록 큰 감흥을 준 소설이 내게는 별 감흥을 안 주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소설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그 소설이 있다.
'부석사'편에서 시인은 "삶이 무겁고 한숨이 깊어지면 새처럼 날아 영주 부석사를 찾을 일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워할 대상이 없어도 그리움이 사무치는 절"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이다. 내가 가 본 부석사는 그토록 슬퍼지는 절은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절을 둘러보았기 때문인지 내게는 부석사가 편안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토록 각자 느끼는 감흥이 다르다.
'해인사'편에서는 고사목이 남았다. 천년 묵은 고사목, 1200살인 느티나무가 보고 싶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해서 언젠가 가보고 싶은 절이었는데, 이제는 늙은 느티나무 때문에 꼭 한 번 들르고 싶어졌다.
'정암사'편을 읽다가 스님의 지팡이에서 자란 나무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다. 영주 부석사의 단풍나무는 의상대사 지팡이에서, 오대산 중대의 단풍나무는 한암스님의 지팡이에서, 정암사의 주목은 자장스님의 지팡이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은 왜 만들어진 걸까?

'상원사'편에서 세조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상원사에 있는 석상이 사실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였던 것일까? 난 내내 호랑이 석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송광사'편에서 "여행은 고행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 된다."라는 구절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 아무래도 시인은 허무주의자에다 마조이스트인가 보다. 진정한 여행 따위는 알지 못하지만 여행은 즐거운 것이 좋다는 것인 내 생각. 여행이 고행이어서는 안 될 일.
송광사에도 지눌스님이 지팡이를 심어놓은 것이 '쌍향수'라는 향나무로 자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말 산사에는 스님 지팡이가 나무로 자란 것이 많기도 하네.
'선운사'편에서 동백나무숲은 화재예방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엄사'편에서 안도현 시인과 벚나무 그늘에서 술 한 잔 일화가 나온다. 수 년 전 읽은 안도현 시집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이 떠올랐 다. 그때 읽은 시 중 감흥이 있어 마음에 남은 시는 한 편도 없었다. 다른 시집은 좀 다르려나...
'팽목항법당'편에서 나는 시인의 상처받은 마음이 전해져와서 안타까웠다.
"평생 먹을 물을 하루에 다 먹은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욕조로 보인다. 나에겐 이 세상도 작은 욕조고 그 욕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깊다. 상처와 죽음은 넓이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에 있다. 그 깊이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래보다 위로 치솟는다......."
물고문을 당한 기억은 시인에게 세상을 지옥같은 곳으로, 고통과 죽음이 만연한 곳으로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의 허무주의가 이해되었다.
에세이집을 덮으면서 그가 다녀온 절들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