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도시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이 책을 집어들고 읽다가 흥미로와서 집까지 대출해서 가져왔다.

저자인 로버트 파우저는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여러 나라의 도시에서 일상을 꾸렸다.
작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아 지금도 언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며, 낯선 땅에서의 짧은 여행보다는 긴 일상을 꾸리는 것을 좋아하는 내게 이 작가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그가 바라보는 도시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내가 이 책에서 특히 궁금했던 것은 교토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전통적이며 미학적인 이미지의 도시로서 쿄토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데 작가는 그곳에서 일상을 꾸림으로써 그 도시의 어두운 점도 잘 파악해 보여준다. 도시공동화, 노령인구의 증가, 경제적 쇠퇴 등.
무엇보다도 내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교토인들의 '품위'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대한 대목이었다.
"어느 날은 기온의 고급 식당을 찾았는데 말 그대로 '품위가 넘치는' 집이었다.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마다 요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듣다 보니 지쳤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의 '품위 있는 대화'에도 흥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오랫동안 식사를 하긴 했는데, 다 먹고 나오니 배가 고프기까지 했다. 서민들이 주로 가는 이자카야에 가서 다른 걸 먹고 싶었지만, 워낙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호텔 라운지에 가서 역시 '품위 있는 칵테일'을 마신 뒤에야 헤어졌다. "(9.그런 곳이면서 그런 곳이 아닌, p.284)
마르셀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 [게르망트 쪽]를 막 다 읽은 시점이라서 그런지 귀족 문화를 지향하는 쿄토에 대한 작가의 글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게르망트 쪽]에 등장하는 19세기말의 왕족의 오만함이 낳는 겸손, 귀족이 겉으로 추구하는 품위와 우아함의 블랙 코미디 못지 않았다. 작가가 본 20세기의 쿄토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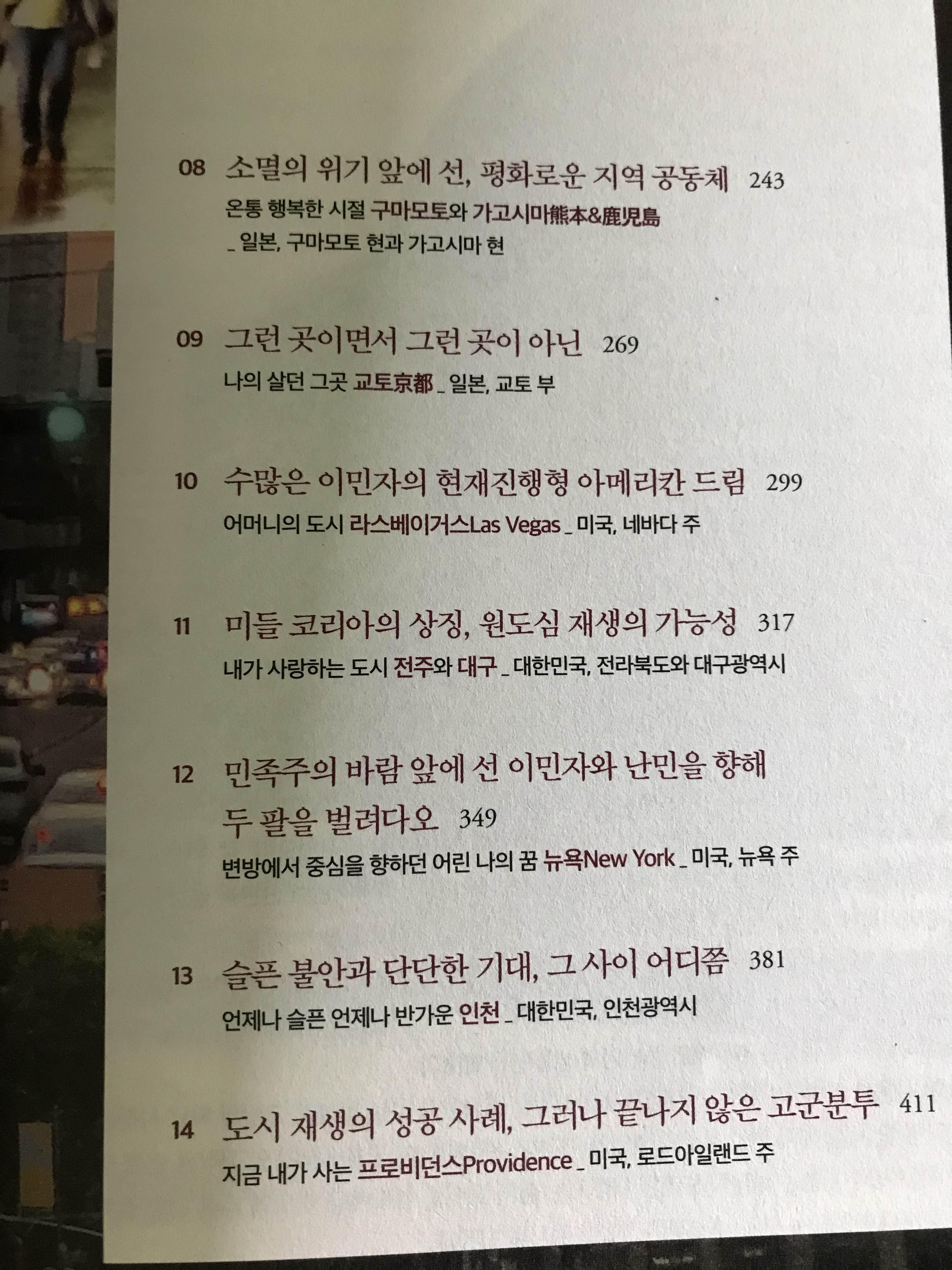
작가가 제안하는 '자신만의 도시사'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살고 있고 분명 도시에서 죽을 나라면 이 작가 못지 않는 '나만의 도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 내 삶 속에서 일상을 꾸린 도시는 모두 여섯 도시. 물론 잠깐 여행으로 며칠간 체류했던 도시까지 거론한다면 훨씬 더 많다. 내가 살면서 거쳐간 도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
"독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 그렇다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만들까를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첫걸음이 바로 자신마느이 도시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나의 제안은 이 책을 계기로 삼아 독자들 스스로 '자신만의 도시사'를 기록해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도시에 태어나 어떤 도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도시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며, 그곳들은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도시와 '나'의 관계에 대해 굉장히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18.책을 펴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