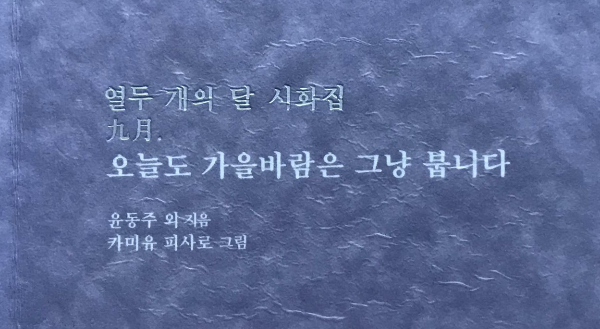
도서관에서 프랑스 시인 프랑시스 잠(1868-1938)의 시집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그의 시가 한 편 실린 시집 [오늘도 가을바람은 붑니다]를 빌려왔다. 이 시집은 책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시인의 시를 모아서 그림과 함께 담은 시화집이다.
시화집은 '열두 개의 달 시화집'.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2권의 시집으로 구성된 시화집 가운데 나는 9월의 시화집을 빌린 것이다.

이 시화집의 그림은 카미유 피사로(1830-1903)의 것이었다. 사실 카미유 피사로의 그림을 직접 본 것이라면 잿빛 하늘의 파리풍경화가 다였던 기억이 난다. 우울하고 쓸쓸한 파리 풍경 그림은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후기인상파인 세잔과 고갱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 시화집을 통해서 본 피사로의 그림들을 통해서 그가 풍경화뿐만 아니라 정물화, 인물화도 그렸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피사로의 그림은 그의 그림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책에 실린 피사로의 그림들은 그다지 큰 감흥을 주지는 않았다. 오늘날 다른 인상파 화가들에 비해서 덜 주목받는 화가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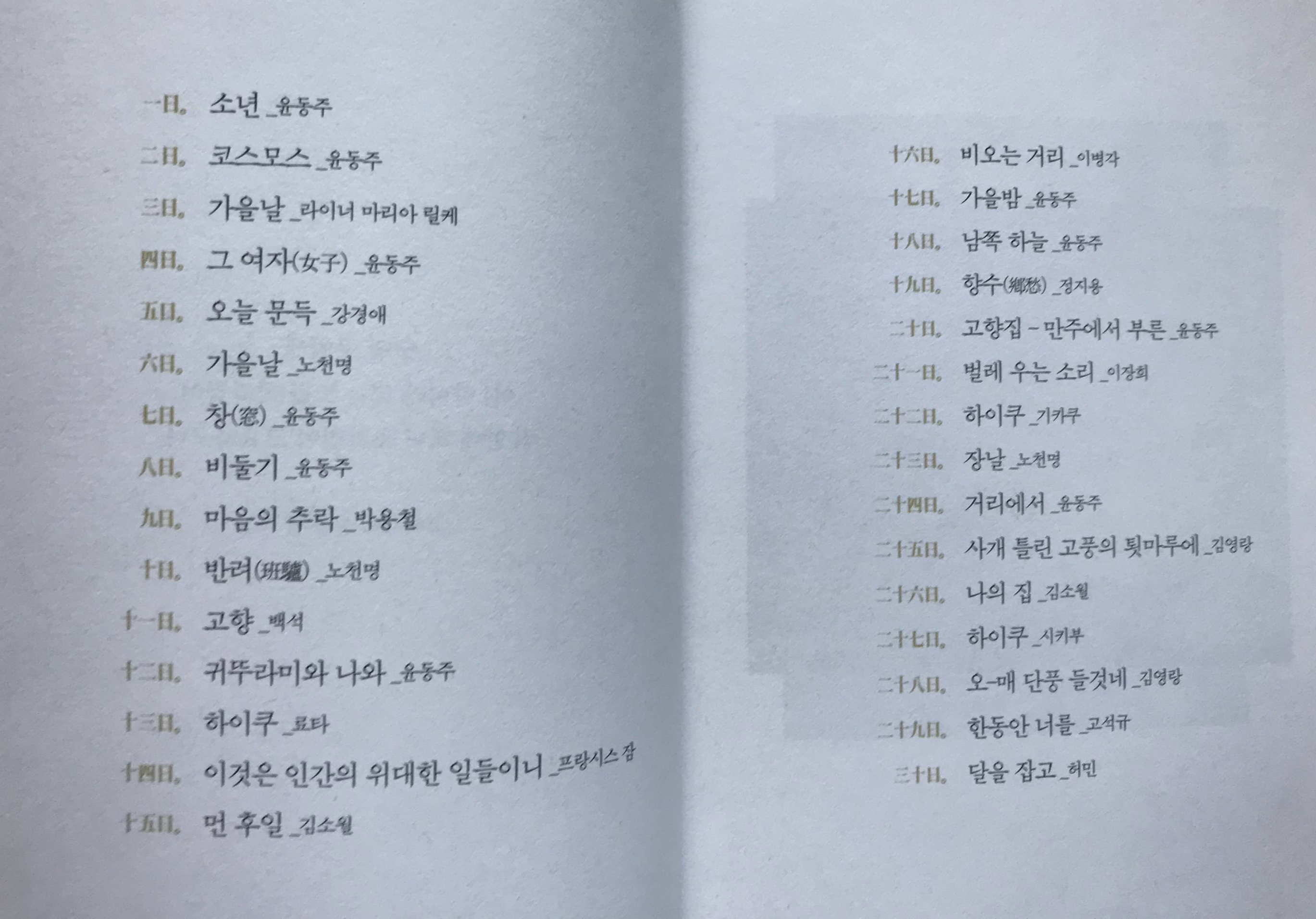
이 책은 매일 한 편의 시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실린 30편의 시는 16명의 시인들의 시였다. 윤동주의 시가 가장 많이 실린 것 같다. 그밖에 김소월, 노천명 등의 시인은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시를 읽어 본 적이 있는 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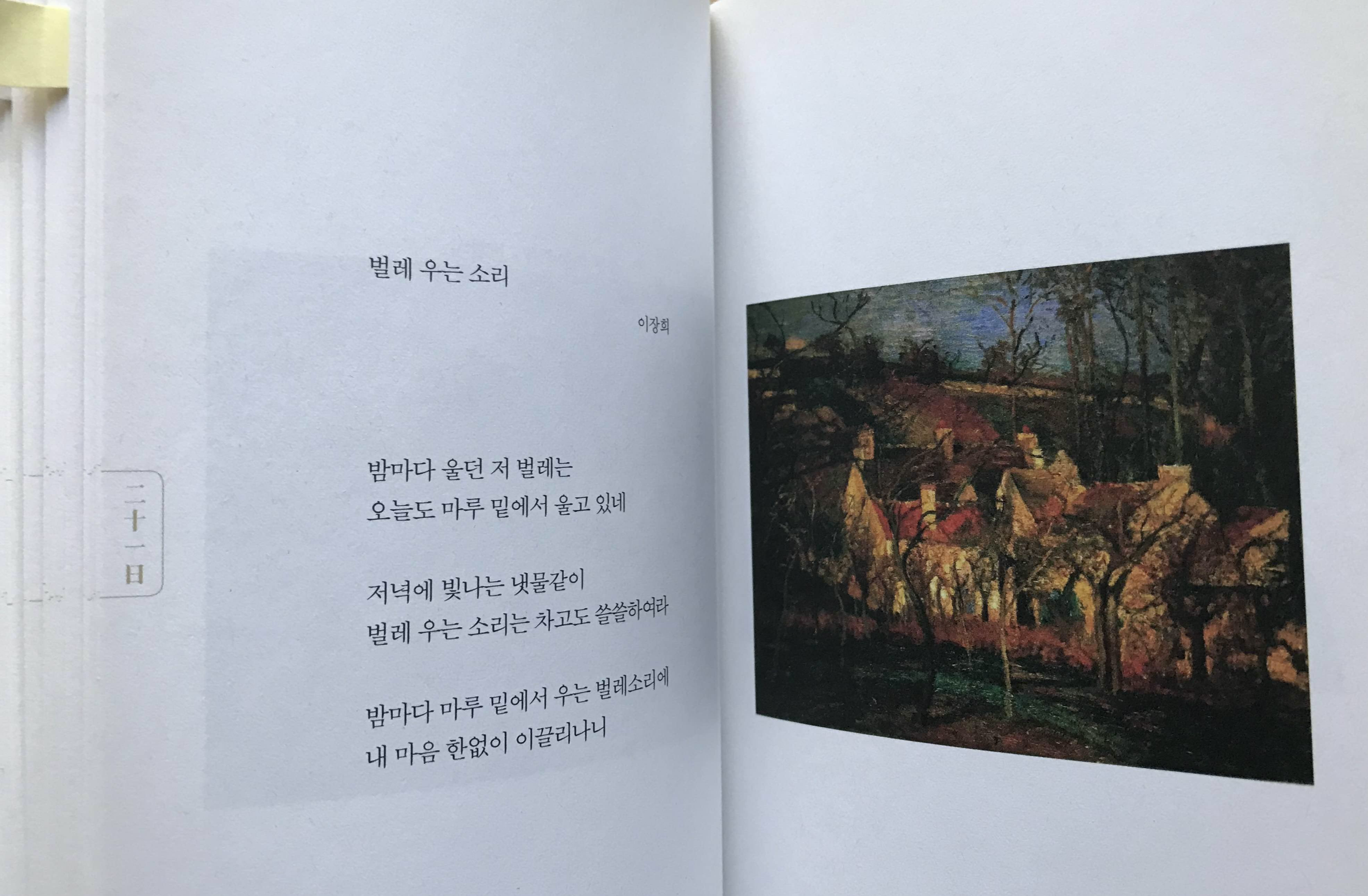
나는 이 책에 실린 우리나라 시인의 시 가운데 이장희(1900-1929)의 '벌레우는 소리'가 제일 좋았다.
이 시는 가을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인에 대해서 지금껏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시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세속적인 것을 싫어해 고독하게 살다 음독자살했다고 하는 그의 이력이 이 시를 더욱더 쓸쓸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장희 시인의 시의 특징은 섬세한 감각, 시각적 이미지의 조형성, 계절변화에 따른 시적 소재 선택이라고 한다.
대표작으로 '봄은 고양이로다'가 있다고. 봄이 주는 감각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시라고 하니까, 봄에 한 번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나라 시인의 시는 그 어떤 시도 감동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윤동주의 '서시'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의 다른 시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기대 이하다.
친구의 말대로, 이 시인이 더 오래 살았다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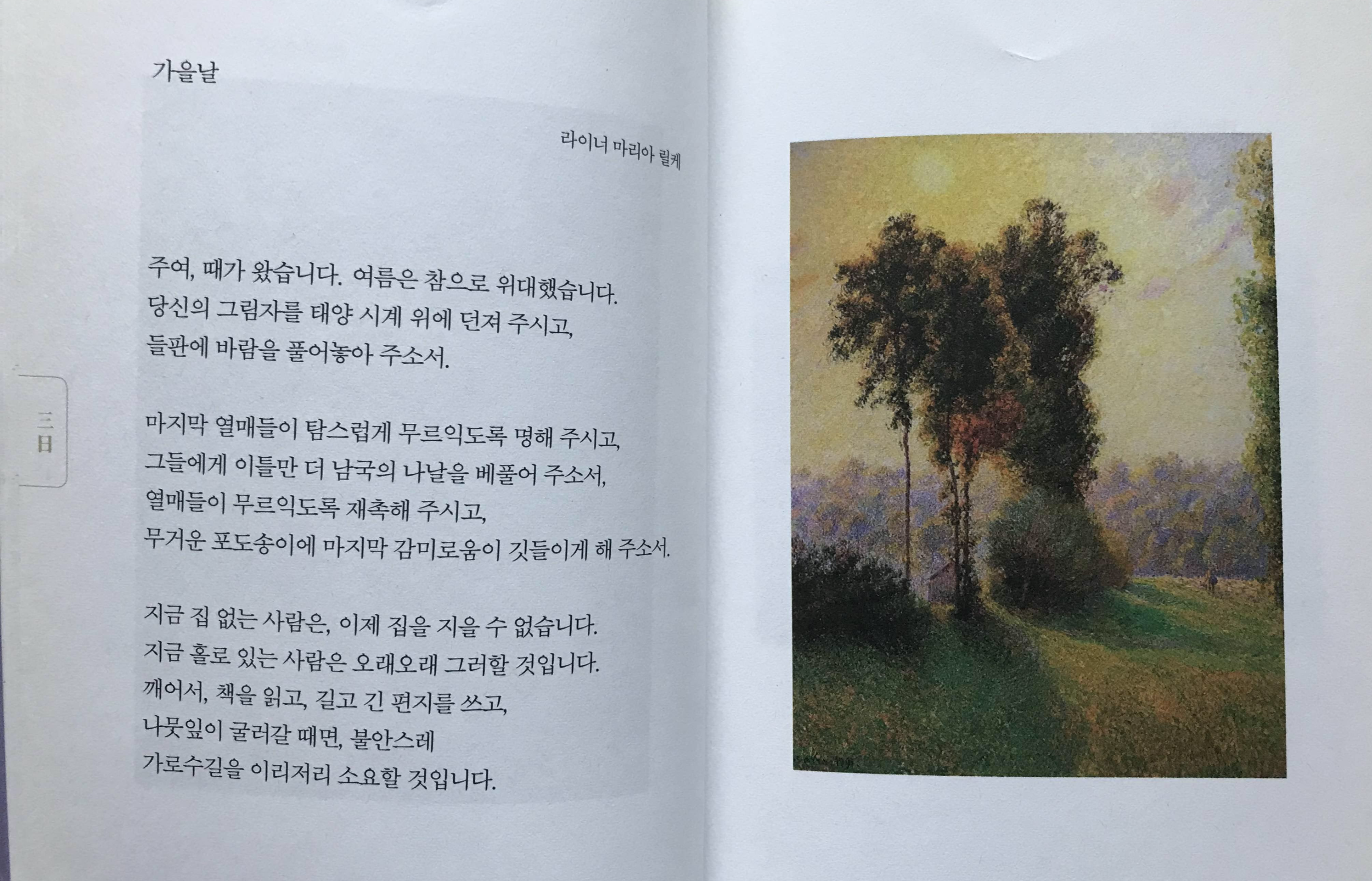
그리고 마음에 든 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4-1926)의 '가을날'.
이 시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겠지만 어렸을 때 이미 읽어본 적 있는 시다.
다시 읽어봐도 감동적이다.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그러할 것입니다"라는 구절은 특히 마음에 와닿는다.
올 한 해 거둘 결실이 거의 없는 내 모습을 그린 듯한 구절이다.

이 시집의 장점은 바로 외국 시의 경우는 원어가 실려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국시의 묘미는 번역되면서 많이 감소된다. 시 원래 언어를 통해서 읽을 때 그 감동이 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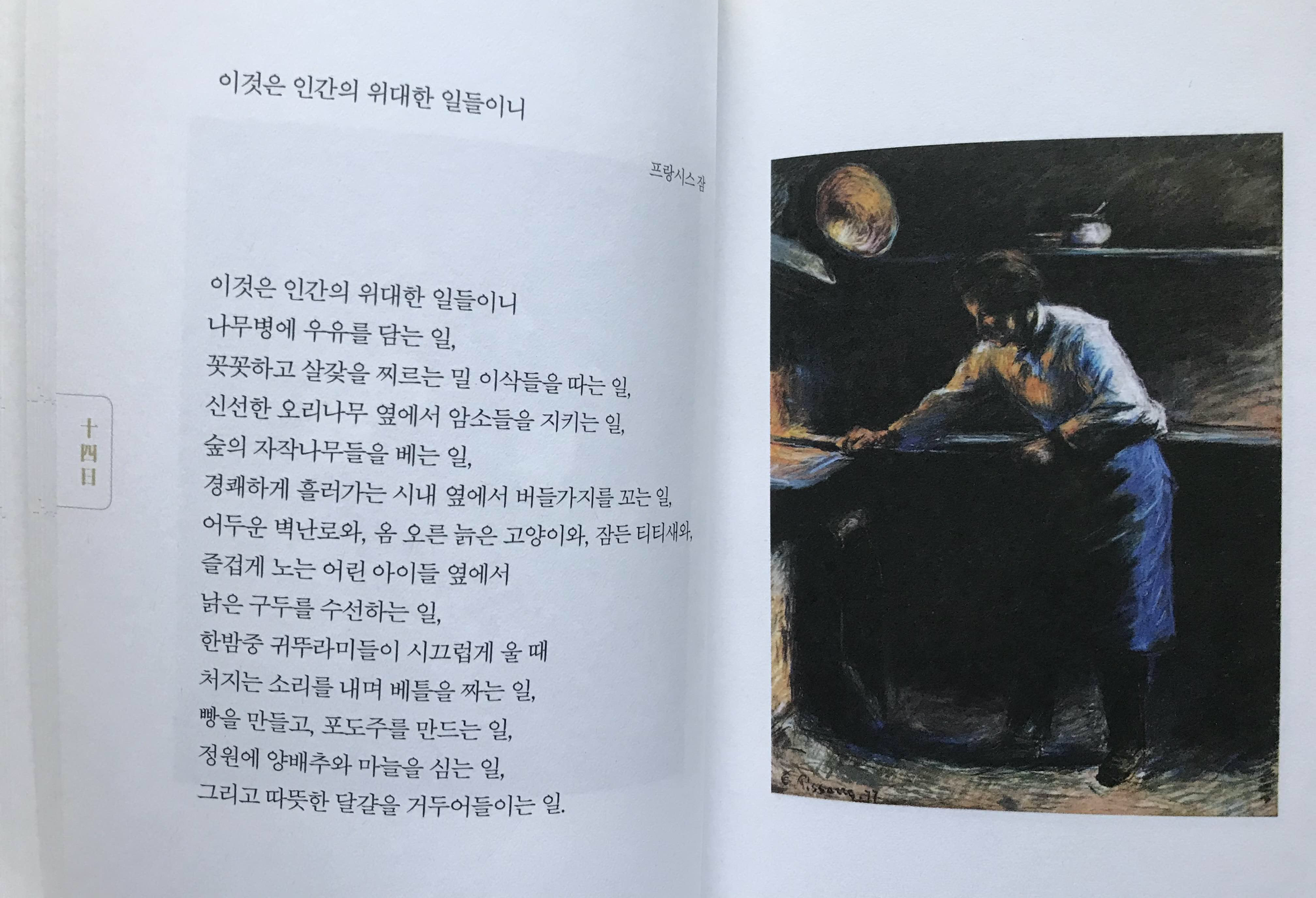
내가 읽어 보고 싶었던 프랑시스 잠(1868-1938)의 시.
'이것은 인간의 위대한 일들이니'는 소박한 노동을 예찬하는 시로 보인다.
우유를 담고 밀이삭을 따고 암소를 지키고 나무를 베고 버들가지를 꼬고 구두를 수선하고 베틀을 짜고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양배추와 마늘을 심고 달걀을 거두는 일은 시골에서의 일상적인 자급자족적인 노동이다.

시인은 거의 평생을 자연 속에서 지내며 글을 썼다고 하니 그런 배경 속에서 탄생할 법한 시다. 건강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시다.
불어로 읽으면 번역에서 알 수 없는 불어 운율이 주는 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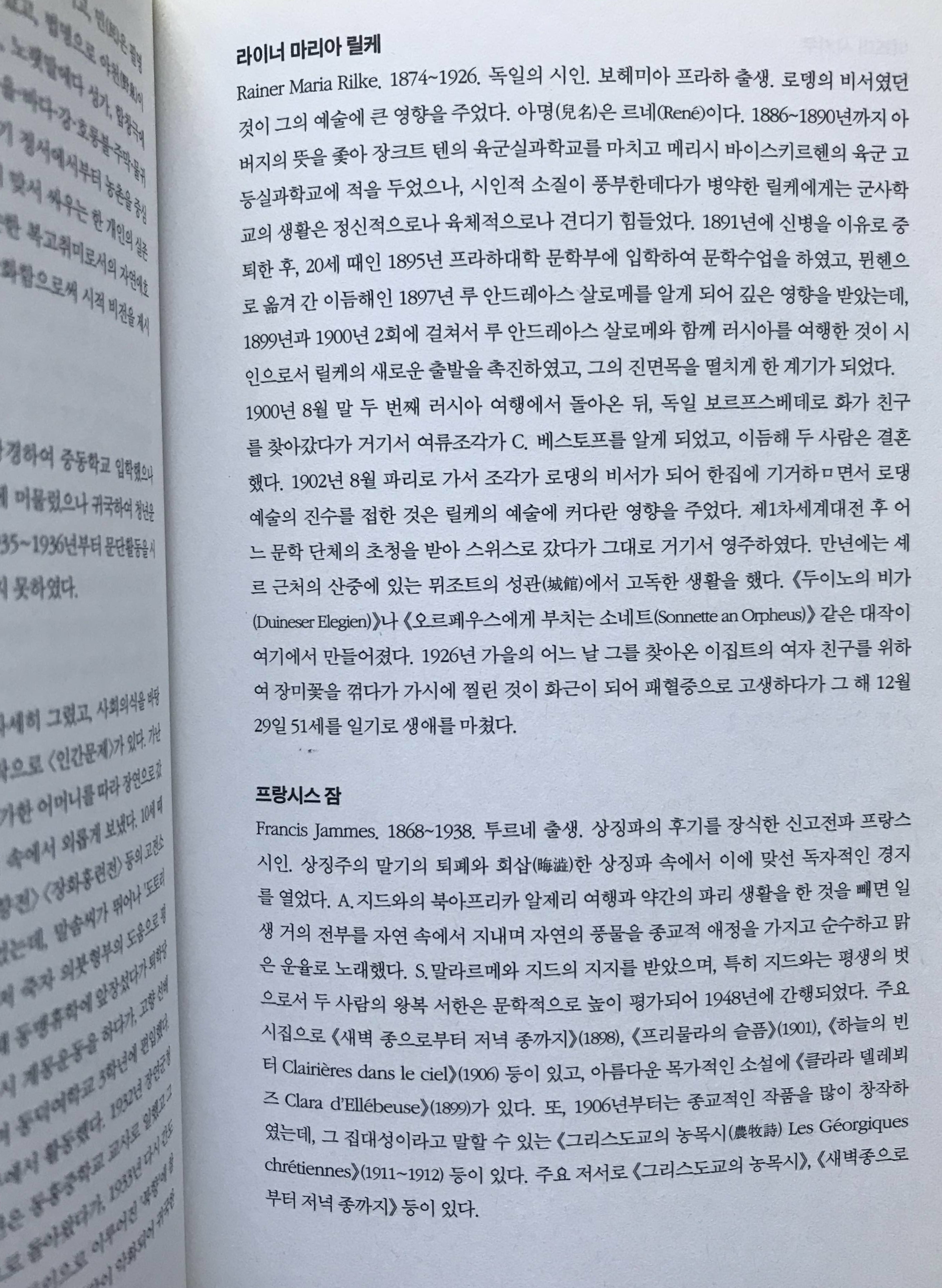
프랑시스 잠과 앙드레 지드가 평생의 벗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둘이 나눈 서신을 묶은 책을 한 번 읽어보고 싶다.
한 권의 시집에서 세 편의 아름다운 시를 건졌으니 나쁘지 않았다.